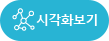| 항목 ID | GC09001306 |
|---|---|
| 한자 | 民間信仰 |
| 영어공식명칭 | Folk Religion|Mingan Sinang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민중의 생활 속에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신앙.
[개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민간신앙의 범주는 크게 고을 신앙, 마을신앙, 가정 신앙, 개인 신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 신앙은 사람들 각각이 교회나 절 등을 다니며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고을신앙]
고을 신앙은 하나의 마을을 벗어나 전근대 사회의 읍치에 해당하는 공간이나 장시, 포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뜻한다. 부여군에서는 임천면 군사리에 있는 임천 유태사 묘(林川 庾太師 廟)[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제8호]가 고을 신앙의 장소이다. 임천은 지금은 부여군에 속하지만, 과거에는 임천군이라는 독립된 군현이자 나라에서 지내던 제사인 소사(小祀)의 의례 장소로 여겨지던 종교적 공간이었다. 임천 유태사 묘는 태사(太師)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장군을 향사하는 사우인데, 유금필은 10세기 무렵 후백제 패잔병들의 노략질과 흉년으로 피폐해진 임천 지역 백성을 구휼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유금필은 나중에 지역의 신령으로 좌정하였으며, 고을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임천 유태사 묘는 조선 시대에도 임천군의 읍치에 있던 신앙의 장소였다.
또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는 조선 후기 저산팔읍(苧産八邑)을 중심으로 한 장시의 발달과 연관된다. 은산리의 마을 제사가 장시의 발달로 말미암아 별신제로 확대·개편되어 마을을 벗어나 지역의 제사, 고을의 제사로 자리하게 되었다.
[마을신앙]
부여 지역의 마을 제사는 주로 정월 중에 행하여지는데, 마을에 따라 산신제·거리제·동화제·탑제·요왕제[용왕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여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제사로는 무량동 산신제·거리제, 금공리 산신제·장승제, 저석리 산신제, 괴목정 노신제, 북촌리 장승제, 곤향산 산신제, 규암리 산신제·당산제·거리제, 문신리 샘제·동화제, 현내리 탑동 탑제, 주암리 행단제, 임천 충혼제, 송국리 산신제·거리제, 송국리 풍년기원제, 가화리 탑제·용왕제와 가회리 장군제, 은산 장벌리 탑제·동화제, 금사리 당산제, 군사리 동화제·당산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은산 장벌리 탑제·동화제는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탑제는 2019년 이후 전승이 중단되었다.
[가정신앙]
부여 지역 가정에서는 집안의 화평을 위하여 가신(家神)을 집 안 곳곳에 봉안하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자 주술적인 의례를 베풀었다. 특히 한 가정에 환자가 발생하면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동토잡이, 잔밥먹이기, 해물리기 등의 주술적 방법을 행하여 병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지리단잡기는 은산면 내지리 마을 주민들이 의약으로 치유되지 않는 피부병인 단(丹)을 모두 합심하여서 잡고자 하였던 집단적인 의례이다.
또한, 정월에 신수를 보아 집안에 신수가 좋지 않은 식구가 있으면 특별히 가정주부가 나서서 거리제나 서낭제, 요왕제 등을 지내기도 하였지만, 주부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사제에게 의뢰하였다. 이때에는 부여 지역에서 활동하던 법사, 보살 등이 집안의 안과태평을 비는 안택굿이나 환자의 치병 의례인 병굿 등을 통하여 독경(讀經)으로 귀신을 위무하거나 내쫓으면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거와 같이 여러 날 경을 읽을 줄 아는 큰 경쟁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만신이나 법사에 의뢰하기도 한다.
- 강성복, 『장벌리 탑제와 동화제』(부여문화원, 2001)
- 『부여의 민간신앙』 (부여문화원, 2001)
- 『부여군지』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간신앙(民間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