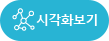| 항목 ID | GC05900010 |
|---|---|
| 한자 | 朝鮮時代最高-名聲-龜岩寺僧侶學堂 |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조용헌 |
[개설]
순창의 영구산(靈龜山)에 있는 구암사(龜岩寺)는 조선 후기 불교 대학교라 부를 만한 곳이었다. 당대에 불교를 대표할 만한 석학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불교학의 맥을 이어 간 곳이다. 당시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삼종선(三種禪) 논쟁이 벌어진 곳이 구암사였다. 조선 시대 불교의 대강백이었던 설파(雪坡)[1707~1791]로부터 백파(白坡) 긍선(亘璇)[1767~1852], 설두(雪竇) 유형(有炯)[1824~1889], 그리고 근세의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1870~1948]으로 이어지는 불교계의 석학들이 구암사에서 공부하였다. 구암사가 이렇게 불교 학문의 중심지가 되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구암사는 그야말로 조선 시대 최고의 명성을 날린 승려 학당이라 부를 만한 사찰로 자리매김하였다.
[근대 불교학의 요람, 구암사]
불교는 경전이 많다. 팔만대장경이다. 2,500년의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천재들이 연구해 놓은 업적들이다. 이것을 밤낮으로 공부하는 직업이 승려이다. 한국 불교사에서 살펴보면 승려들이 대학자이고 석학이었다. 신라의 원효(元曉), 고려의 의천(義天), 균여(均如), 지눌(知訥), 일연(一然)이 그러한 석학들이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불교가 탄압과 천대를 받으면서 이러한 ‘석학적 전통’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년 동안 축적되어 내려온 불교의 공부하는 전통이 완전히 끊어지기야 하겠는가? 조선 후기에 호남 순창군의 영구산 구암사에는 당대 불교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머물면서 불교학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었다. 조선 후기 불교의 서울 대학교가 ‘구암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암사의 불교 학맥]
조선 후기 불교의 대강백이었던 설파로부터 시작하여 제자인 백파 긍선을 배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설두 유형, 그리고 근세의 석전 박한영이 공부하였던 절이다. 어느 문파가 분야가 확고한 전통을 갖추려면 3~4대가 내리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흔히 말하는 할아버지 대의 창업(創業), 아버지 대의 수성(守成), 손자 대의 경장(更張)이 한 바퀴 온전히 돌면서 뿌리가 확고하게 내리기 때문이다. 구암사의 설파, 백파, 설두, 석전의 석학(碩學) 4대는 이상적인 한 바퀴에 해당한다.
[백파 선사와 삼종선 논쟁]
백파는 어떤 인물인가? 유학자들에게 눌려 조선 후기 불교가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불교계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된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삼종선(三種禪) 논쟁이었다. 이 삼종선 논쟁의 근거를 제시한 인물이 백파이다. 선(禪)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의리선(義理禪), 여래선(如來禪), 조사선(祖師禪)이 백파가 주장한 그 세 가지 선이다. 의리선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수준의 선을 말하고, 여래선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선으로서 소승 불교에서 행하는 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사선은 가장 차원 높은 단계의 선법(禪法)인데, 중국과 한국의 역대 조사(祖師)들이 실천하였던 선법이다. 화두(話頭)를 들어 의심을 일으켜 번뇌 망상을 없애 버리는 선법이 조사선이다. 백파가 조선 불교의 선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선문수경(禪門手鏡)』이라는 저술에서 이 ‘삼종선’을 발표할 무렵 구암사에는 조선 8도의 승려들이 운집하였다고 한다. 당대 불교계의 걸출한 스타를 만나 보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다.
백파의 삼종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유학자가 있었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이다. 거기에다가 추사와 친하였던 초의 선사(草衣禪師)도 백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다선 일미(茶禪一味)’로 유명한 다승(茶僧)인 초의 선사와, 당대의 주류 식자층이자 추사체의 대가인 김정희가 불교계의 논쟁에 가세함으로써 이 삼종선 논쟁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언어도단의 세계인 선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는 반론이었다.
백파의 주장은 언어도단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알아듣기 위해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불교계 내부에서만 논쟁이 이루어졌다면 전국적 파급력이 약하였겠지만, 당대의 일급 지식인인 추사가 개입함으로써 지역구 문제에서 전국구 이슈로 확대된 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불교와 유학자 간의 대화이기도 하였다. ‘유불 소통(儒佛疏通)’이었다고나 할까. 당시 주류 양반 계급이었던 추사가 천대받던 비주류 계급이었던 불교 승려를 위해서 유일하게 남긴 비문인 백파 긍선 비(白坡亘璇碑)[일명 대기대용비(大機大用碑)]가 지금 선운사(禪雲寺) 입구에 서 있게 된 계기도 이 삼종선 논쟁으로 인한 인연 때문이다.
[구암사는 조선 불교의 서울 대학교였다.]
조선 후기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삼종선 논쟁이 이루어졌던 현장이 바로 순창의 구암사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다. 이슈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는 이경상(李炅相)이었는데, 이 관찰사는 백파의 학식과 인품에 감복하여 전답 350마지기를 구암사에 기부하였다고 전해진다. 전라 관찰사를 감복시킬 만큼 백파의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일화이다.
백파의 제자가 설두 유형이다. 구암사에서 백파로부터 배웠다. 설두는 스승인 백파의 논지를 충실히 계승하였다. 백파를 반박하는 입장에서 저술한 초의 선사의 『선문 사변 만어(禪門四辨漫語)』와, 우담(優曇) 홍기(洪基)의 『선문 증정록(禪門證正錄)』을 설두는 반박하였다. 그것이 『선원 소류(禪源溯流)』라는 설두의 저술이다. 이 삼종선 논쟁은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대를 이어서 계속 양쪽 진영에서 논박이 이어졌다. 설두는 백파 다음으로 구암사의 선풍과 학풍을 계승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스승이 대접받는 이유는 제자를 잘 두어서이기도 하다. 제자가 잘나면 스승이 사후에 높여진다. 제자가 못나면 스승도 묻힌다. 제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백파의 뒤를 이어 설두라는 검객이 등장하여 스승의 논지를 계속 설파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불교 사찰이 화재로 폐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승병들이 왜군과 싸운 탓이다. 일본도 불교를 믿었으므로 승병들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왜군들이 사찰에 불을 지를 이유는 없었다. 산속의 사찰은 세간사에 무관한 탈세간(脫世間)의 공간 아닌가! 유교에 천대 받으면서도 불교는 임진왜란에 깊숙하게 개입하였고 그 대가는 절이 불타는 것이었다. 유교의 탄압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임진왜란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 거의 주저앉게 된 조선 불교. 그 주저앉은 상황에서 재기의 몸부림이 일어났으니,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가 호남 불교요, 구암사였다.
여기서 호남 불교라 하면 해남의 대흥사와 순천 조계산의 선암사가 해당된다. 구암사, 대흥사, 선암사는 불교 부흥의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암사는 이 삼각 편대의 제일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듯싶다. 삼종선 논쟁에 가담하였던 초의선사도 대흥사 권역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으니, 당시 호남 불교의 삼각 구도를 떠올릴 수 있다.
[구암사 박한영의 제자들]
설두의 뒤를 이어 석전 박한영이 나왔다. 백파의 구암사 제자 가운데는 ‘설(雪)’ 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 설유(雪乳) 처명(處明)[1858~1904]도 그 중 하나이다. 설유는 설두와 사형사제(師兄師弟) 간이 된다. 석전은 설유 처명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다. 석전은 1948년에 열반하였으니까 광복 후 3년까지 생존하였던 근세의 인물이다.
석전에 대해서 전해 오는 이야기는 일람첩기(一覽輒記)의 비상한 두뇌를 가졌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한 번 읽어 보고 외워 버리는 기억력’을 가리켜 ‘일람첩기’라고 한다. 석전은 비상한 두뇌였다. 경전을 한 번 보면 머릿속에 저장해 버리는 인간 스캐너 같은 머리였다. 그러다 보니 “팔만대장경이 석전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경전에 관한 내용을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주었다. 공부는 일차적으로 기억력이다. 기억력이 좋으면 이치에도 해박하게 된다.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석전을 만나 보러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들었다. 인재는 인재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인재는 대화할 사람이 적기 마련이다. 자기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 보려 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지적 자극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선지식을 만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이야기 나눌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전국의 난다 긴다 하는 수재들이 소문을 듣고 산골짜기인 순창 구암사에 몰려들었다. 때는 일제 강점기이다. 나라도 없고, 과거 시험도 없고, 일본 사람 밑에는 들어가기 싫고, 그렇다고 총 들고 만주에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시인 이상(李箱)처럼 술만 먹으면서 한 세상을 보내기는 싫었다. 비전이라고는 없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석전 같은 선지식은 수재들이 따를 만한 석학이자 도인이었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춘원 이광수(李光洙), 청담 선사, 승려 운허, 시인 조지훈(趙芝薰), 신석정(辛夕汀), 서정주(徐廷柱)[1915~2000] 등이 당시에 석전을 찾아와 지도를 받았던 학인들이었다. 최남선이 1920년대에 쓴 유명한 기행 산문집인 『심춘 순례(尋春巡禮)』는 그 배경에 박한영의 안내와 지도가 있었다. 조지훈, 신석정, 서정주의 이력에 보면 ‘혜화 전문학교 수료’라고 되어 있다. 혜화 전문학교가 들어가면 이게 다 석전의 문하에 있었다는 표시이다. 석전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조선 불교 전문 강원’의 교장을 맡았고, 이 강원이 발전하여 혜화 전문학교가 세워졌을 때 ‘혜화 전문학교의 학장을 맡았다. 이 혜화 전문학교가 후일 동국 대학교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 불교학의 요람인 동국 대학교의 전신까지 학문적 종장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석전 박한영이었고, 석전의 학문적 온축과 함양이 순창 구암사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도 일제 강점기 때 여러 번 구암사에 와서 석전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약 8개월간을 머물기도 하였다. 만해가 구암사 시절에 남긴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구암폭(龜岩瀑)」이라는 제목이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 기호학파의 마지막 좌장인 간재(艮齋) 전우(田愚)[1841~1922]도 여러 번 구암사에 다녀갔다고 전해진다. 석전과 유불 간에 많은 문답을 주고받았던 것 같다.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불교 천재인 석전과 유교 천재인 간재 사이에 종교를 뛰어넘어 인간적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구암사의 인문 지리적 환경]
이쯤에서 순창 지역과 구암사가 자리한 복흥면 일대의 인문 지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토양이 좋아야 명찰(名刹)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선 순창은 내륙 깊숙한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들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골짜기 사이로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전답이 넓게 퍼져 있다. 그런가 하면 적성강(赤城江)이 멀리서 감아 돌고 경천(鏡川)이 읍내를 관통해서 흐른다. 이 두 개의 하천이 섬진강으로 합류된다. 당연히 물이 좋다. 논밭이 많고, 물이 좋고,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 후기에 좋은 거주지로 각광 받았다.
내륙 깊숙이 있다는 점이 왜 장점인가? 왜구의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이다. 고려 말기에 서남해안 가까운 지역에는 수시로 왜구들이 배를 타고 몰려와 노략질을 하였다. 그러나 내륙 깊은 곳은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이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 순창으로 이주해 왔다. 또한 강의 상류 지역은 물이 깨끗한 법이다. 전염병이 돌 때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지금은 순창이 시골 벽지지만 당시에는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 받던 주거지였다.
순창은 고지대이다. 구암사가 자리 잡고 있는 복흥면도 고지대에 속한다. 해발 300m에 달한다. 인근의 쌍치면, 구림면이 모두 산간 분지의 형태이다.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전답이 넓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해발이 높으니까 발효 식품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인물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백양사 방장을 지낸 송만암(宋曼庵)도 복흥 출신이다. 역시 백양사 방장을 지낸 수산당(水山堂)도 복흥, 판소리 서편제의 창시자인 박유전(朴裕全)은 복흥면 서마리 출신이다. 구한말의 유명한 유학자인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도 복흥면 화양리 출신이다. 바로 구암사 아랫마을이 화양리이다. 해방 후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金炳魯)[1887~1964]가 또한 복흥 출신이다.
[구암사와 백양사, 내장사의 연결]
영구산은 신령한 거북 산이다. 산 전체가 거북 모양이다. 작은 거북도 절 앞에 있다. 암거북 바위는 법당 바로 밑에 있고, 수거북 바위는 절 입구에 있다. 문필봉도 빼어난 게 있다. 구암사에 학승들이 많이 와서 공부한 풍수적인 이유를 찾자면 문필봉이 앞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야 한다. 근처의 백양사를 내려다보는 커다란 암벽 봉우리가 백암산의 상왕봉(上王峰)이다. 이 상왕봉 맥이 구암사 방향으로 쭉 내려오다가 우뚝 하나 솟았는데, 그것이 붓처럼 생긴 문필봉이다. 구암사 정면으로 보인다. 동네 사람들은 뾰쪽하다고 해서 살봉[화살봉]이라고 부른다. 누가 보아도 예리한 문필봉이다. 이 문필봉의 정기를 받아서 구암사에는 학승들이 많이 배출되었는가 보다.
구암사는 공부하는 승려들의 학교였다. 신도들이 출입하는 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승려들만을 위한 불교 아카데미였다. 출입하는 신도들이 별로 없었던 절이었다. 구암사에서 보면 백양사도 한 시간 남짓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고, 내장사도 역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다. 내장사와 백양사에 있는 승려들이 새벽밥을 먹고 걸어서 구암사에 와서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백양사와 내장사의 중간에 구암사가 있었다.
6·25 전쟁 때 국군의 작전에 의해 절이 전소된 이후에 거의 폐사 상태로 이어 왔다. 그러다가 선운사 문중인 승려 지공(智空)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롭게 절을 지키고 있다. 신도가 별로 없는 절이라는 전통은 조선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공부가 무엇입니까?”라는 필자의 질문에 “휴거헐거(休去歇去)에 철목개화(鐵木開花)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고 또 쉬면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는 선가(禪家)의 말씀이다.
- 각안, 『동사 열전(東師列傳)』(1894)
- 이능화, 『조선 불교 통사(朝鮮佛敎通史)』(1918)